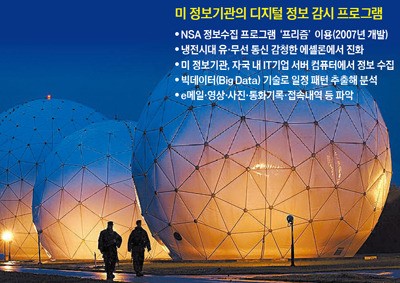 |
|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 공군기지의 인공위성 통신용 레이더돔. 냉전시대 미국영국 등이 전 세계 유ㆍ무선 통신망을 감시했던 에셸론 시스템의 일부라는 주장이 있다. [미 해군] |
미국 유타주 북동부의 블러프데일. 절벽(bluff)과 골짜기(dale)라는 단어를 합친 이름대로 첩첩 산골의 한적한 지역이다. 인구 7600명의 이 조용한 곳에는 무려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가 들어가는 거대 시설을 공사하느라 한창이다. 유타 데이터 센터(UDC)라는 이름의 초거대 전자 데이터 저장시설이다. 약 14만㎡의 대지에 9300㎡의 데이터 저장시설과 8만3600㎡의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올해 9월 완성되면 각종 위성과 해저 케이블 등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와 통신 기록 등 모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다. 2015년까지 완전 가동될 예정이다. 이곳의 저장용량은 요타바이트 급으로 알려졌다. 요타는 10의 24승인데, 하드웨어 용량으로 최근에야 쓰이기 시작한 단위인 테라의 1조 배나 된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10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천문학적 용량이다.
이 공사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맡고 있다. 시설 자체가 국가정보국(DNI·미국 최고 정보기관) 등 16개 정보기관을 일컫는 미 정보 커뮤니티(IC)의 국가 사이버보안 계획(CNCI)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타주는 모르몬교의 본거지로 해외 선교사 파견 경험자가 풍부해 외국어 해독 능력자를 구하기 쉽고, 그들은 종교인이 대부분이라 신뢰성과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전기료도 싼 편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안보의 최전선에 적합한 지역인 셈이다.
그런데 UDC의 완공을 석 달 앞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헤게모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S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들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야후, AOL, 스카이프, 유튜브, 애플 등 미 정보통신(IT) 기업의 중앙 서버에 접속해 e메일·사진·동영상·음성 자료 등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7일 폭로되면서다. 국가안보 활동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충돌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2001년 9·11 테러 이후 생긴 애국법 때문에 미 정보기관은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얻는 게 합법적이다.
성난 유럽, "미국과 관계 재설정" 주장도
문제는 미 기업들의 이용자가 미국인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유럽 각국이 펄쩍 뛰고 있다. AP통신은 12일 “미 정보기관이 자국의 IT 기업을 통해 유럽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감시한 사건에 대해 유럽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함부르크시 요하네스 카스파르 프라이버시 위원은 “미국이 영장 없이 영구적으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과거 공산주의 동독의 비밀경찰을 떠올리게 한다”며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소피 벨트 의원은 “미국이 5억 유럽인의 모든 개인적인 통신에 무제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어 조치를 촉구했다. 자비네 로이토우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유럽은 미국 정부 자체의 투명성을 원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감청이 미국에선 합법이라도 외국인까지 감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도 역공에 나섰다. 미국에 대한 해킹 진원지로 늘 비난받다가 미국도 대대적인 해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는 지구촌 곳곳에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음 주 베를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선 독일이 발벗고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이를 의식했는지 독일의 다른 고위 관리는 “(메르켈 총리가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독일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독일은 미 정보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 민간 차원에선 할 말이 많겠지만 미국의 대(對)테러 정보를 받아보는 유럽 각국 정부의 입장에선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구조 대공사 없인 개선 불가능
유럽의회의 정보전쟁 전문가인 게오르크 슈미트는 “유럽인들은 NSA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좀 불쾌하겠지만 이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슈미트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에셸론 보고서』를 2001년 유럽의회에서 발간한 인물이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그런 일을 하면서 미국이 전자 감시를 한다는 데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디지털 감시에 유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100% 안전과 100% 프라이버시와 0% 불편함을 동시에 누릴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듯 미국이 나눠주는 대 테러 정보를 얻어 쓰는 마당에 유럽 정부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디지털 패권에 도전할 나라도 없는 게 현실이다.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디지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며 “10대 글로벌 IT 기업 중 MS·인텔·HP·시스코·애플·구글·페이스북·IBM·오라클 등 9개가 미국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전 세계 IT시장에서 DB 관리시스템은 오라클,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는 시스코, 컴퓨터 칩은 인텔, 운영체제는 MS의 제품이 지배한다. 또 인터넷은 구글, 각종 기업 정보화 컨설팅은 HP·IBM이 석권하고 있고 모바일 쪽은 애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 덕에 미국이 사이버 헤게모니를 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는 구조상 미국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인터넷 구조상 디지털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길을 거치는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옆방에 보내는 e메일도 미국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어느 시대라도 정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미국을 지난다는 사실만 알려졌는데 이번에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다 필터링하고 도청하며 전 세계 정보를 장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사이버 독립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김 교수는 “지금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인터넷 기본 구조를 뜯어고쳐 자국 내 디지털 정보 이동은 자국만 지나가도록 설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전 세계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장비가 미국 것이라 그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그러려면 인터넷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대공사가 필요하며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대 KAIST 교수는 “중국도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예산·실력 면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정보가 미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미 정보기관이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이를 샅샅이 뒤져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오는 9월 UDC가 완공되면 모든 데이터를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돼 디지털 헤게모니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지구촌의 삶과 디지털 사용 문화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솔로 (0) | 2013.06.18 |
|---|---|
| [스크랩] 그들은 왜 죽어서도 `알몸의 상품`이 되었나 (0) | 2013.06.16 |
| [스크랩] 21세기 풍속화 `한복 내숭女`에 깔깔 웃다 (0) | 2013.06.12 |
| 장기이식을 위한 납치 괴담 분석 (0) | 2013.06.10 |
| [스크랩] 섬, 육지, 그리고 그리움 (0) | 2013.06.09 |